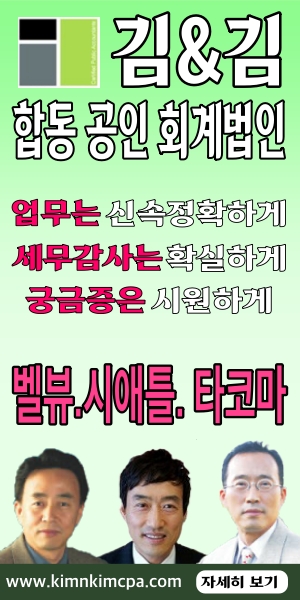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핑퐁 핑퐁
- 00:40:48
이 에스더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핑퐁 핑퐁
엄두가 나질 않는다. 바깥일을 조금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땡볕 아래서 운동이라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을 딴 류승민 선수의 결승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십 년도 더 지난 경기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뒤늦게 그의 열성팬이 되었다. 같은 경기를 두 번째 보는데, 탁구공이 TV 화면에서 또르르 굴러 나와 마음에 쏙 들어왔다.
남편과 의기투합하여 집에 탁구대를 들이기로 했다. 공간이 문제인데, 놓을 만한 곳이라곤 거실뿐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거실을 정리하기로 했다. 기역 자로 놓여 있던 소파를 나누어 큰 것은 방으로 옮기고, 작은 것은 거실의 구석에 두었다. 테이블까지 치우고 나니 탁구 칠 만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등학교 땐 오십 미터를 끝까지 달려본 적이 없고, 입시 체력장에서 친구들이 다 만점을 받을 때 나는 최저점을 받았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던지고 매달려도 출석 점수밖에는 받지 못했다. 대학 때는 수영과 농구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수영장에선 맥주병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농구대에 공을 넣어보지 못했다.
그런 뼈아픈 기억 탓이었는지 나는 아주 오랫동안 운동은 선수들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눈으로만 즐기는 운동에 만족하며 살던 어느 날, 아이들과 YMCA엘 갔다가 농구공을 한번 던져보았는데 어머나, 공이 쑥 들어갔다. 이럴 리가 없는데, 실수려니 했다. 혹시나 해서 던졌는데 세상에, 실수가 아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나 그 후에도 나는 여러 차례 공을 넣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십 년이 지나서 남들도 다하는 골프를 해보겠노라고 골프채를 잡아보았다. 나도 멋진 샷 한번 날려보고 싶었다. 가르치는 대로 힘껏 했지만 결국 주위 사람 모두가 말렸다. 정말 나는 안 되는 걸까.
기죽은 모습이 안돼 보였던지 남편이 내 팔을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소나기가 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지는데 실내는 올림픽 경기장처럼 탁구의 열기로 뜨거웠다. 선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신기에 가까운 재주를 부리고 있었다. 어찌 내가 여기서 감히, 주춤거리다가 남편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선심 쓰듯 탁구채를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탁구를 이젠 매일 저녁 집에서 치고 있다.
핑퐁, 핑퐁, 기분 좋게 오가는 하얀 공이 날아다니는 종합 비타민 같다. 작은 공이 옆구리를 간질이면 민들레 홀씨 같은 하얀 기쁨이 온 집안을 날아다닌다. 무딘 감각이 차츰차츰 깨어나면서 탁구의 감칠맛을 알아가는 중이다. 제법 공을 받아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이 덕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었다. 이제야말로 몸치, 운동치의 꼬리표를 떼어낼 때가 되었다.
입시생처럼 국·영·수에만 매달려 살던 시간이 오래였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던 그때, 잠시라도 딴전을 부리고 나면 그 이상으로 메꾸고 치러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다. 끝없이 달려야 할 것 같던 시간도 어느덧 지나가고, 마침내 경주마에게서 차안대를 떼어냈다. 한눈을 팔아도, 딴전을 부려도 괜찮은 느긋함이 내게도 주어졌다. 거실에 퍼지는 탁구공 소리가 경쾌하다. 작은 공이 오가며 그간의 엇박자를 맞춰주고 흐트러져 있던 것들의 자리를 찾아 주는 것 같다.
오래 전 잠시 잡아보았던 붓의 촉감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그림을 시작했다. 화실로 향하던 첫날, 마음엔 봄바람이 일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자 후회가 되기도 했다.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는 이가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일 년쯤 지나자 그림 몇 점이 우리 집 벽에 걸렸다.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며 어깨를 도닥여주는 사람이 있어 붓을 쉽게 놓지 않을 것 같다. 실력이 좀 늘면 그림을 보며 나란히 서 있는 부부의 뒷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보고 싶다.
탁구를 열심히 치는 중에, 예체능 부흥기란 말이 입에서 톡 튀어나왔다. 다소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 그 말이 내게는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예체능을 프리즘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간 무색이었던 일상이 그림을 그리고 탁구를 하면서 다채로운 색과 분위기를 새롭게 자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탁구대 앞에 마주 선다. 서로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탁구 삼매에 빠져든다. 땀과 함께 웃음이 흐르는데 핑퐁, 핑퐁, 야무진 공 소리에 밀려난 어둠이 저만치서 유리창 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문학회 협회지 <시애틀문학>18집, 한국문인협회 ‘우수 문학지’로 선정
- 김필재 대표 이끄는 금마통운, 시애틀방문으로 새 도약 다짐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1일 토요산행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10월 10일~10월 16일)
- 샛별, 알래스카 앵커리지서 개천절 축하공연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올해 으뜸봉사상 시상식 열어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 US메트로뱅크,SBA 대출실적 두배 이상 증가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 시애틀한국교육원, 책 향기 가득한 ‘단풍빛 독서주간’ 운영
- 워싱턴주 고속도로 곳곳 낙서범 잡고보니 한인이었다
- 제12회 한반도 포럼, 워싱턴대에서 열린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교생이 함께한 한가위 큰잔치
- 아태문화센터 추석행사 개최
- 한인입양가족재단(KORAFF), 할로윈 축제 개최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교사 사은의 밤 및 교육기금 후원의 밤 개최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또다른 전시회 연다
- "한인 여러분과 떠나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모네의 세계”
- 시애틀 한인들을 위한 특별재정 워크샵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은?
- 올해 워싱턴주 단풍 ‘짧고 빨리’ 물든다
- 타코마인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격… SWAT 투입 후 자진 항복
- 페더럴웨이 18세 여성 살해사건, 10대 2명 살인혐의 기소
- 시애틀, 연장 15회 혈투 끝 승리…24년 만에 ALCS 진출
- 워싱턴주 우편투표 주의보… “우체국 소인날짜, 실제 접수일과 다를 수 있다”
- 스타벅스, 시애틀지역서 974명 추가 해고
- 타코마지역 스패너웨이 주택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일부 시애틀시 직원들은 1주일에 이틀만 출근한다
- 시애틀 매리너스, 운명의 ALDS 5차전…내일 오후 5시 첫 투구
- 항공편 취소되면 환불만 가능…셧다운 ‘대란’
- <속보> 워싱턴주청사 난입 기물파손 前 마이너리그 선수, 중범죄 기소
- "이럴 수가" 매리너스 불펜 붕괴하면서 역전패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