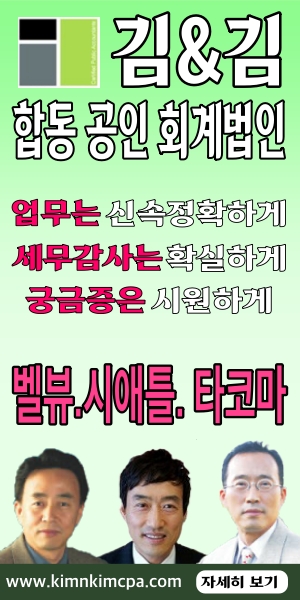노벨물리학상, '손에 잡히는 양자역학' 구현한 클라크·데보럿·마티니스
- 25-10-07
"전기 회로에서 거시적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 발견"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양자역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한 세 명의 미국 대학 소속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존 클라크(83) UC버클리 교수, 미셸 데보럿(72) 예일대 및 UC 샌타바버라 교수, 존 마티니스(67) UC 샌타바버라 교수를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상 사유는 "전기 회로에서 거시적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 현상이 얼마나 큰 체계에서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물리학의 오랜 질문에 답을 제시했다.
세 과학자는 1984년부터 1985년 사이에 진행한 일련의 실험에서 초전도체 소자를 이용해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큰 전기 회로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입자처럼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관측했다.
이는 양자역학의 법칙들이 원자 수준을 넘어 거시 세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사례다.
 왼쪽부터 존 클라크(83) UC버클리 교수, 미셸 데보럿(72) 예일대 및 UC 샌타바버라 교수, 존 마티니스(67) UC 샌타바버라 교수.
왼쪽부터 존 클라크(83) UC버클리 교수, 미셸 데보럿(72) 예일대 및 UC 샌타바버라 교수, 존 마티니스(67) UC 샌타바버라 교수.
실험의 핵심은 '조셉슨 접합'이라는 특수 장치를 이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저항이 0인 초전도체 사이에서 얇은 절연층을 삽입한 이 회로에 전류를 흘려보냈다. 고전물리학에 따르면 에너지 장벽에 갇힌 입자는 장벽을 넘어갈 수 없지만, 이 거대 시스템은 마치 벽을 통과하듯 장벽을 뚫고 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보였다.
또 이 시스템은 연속적인 값이 아닌 사다리처럼 띄엄띄엄 떨어진 특정 값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자화' 특성도 보였다.
이들 발견은 순수 이론과 미시세계에 머물던 양자역학을 공학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수상자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초전도 회로는 오늘날 가장 유력한 양자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를 만드는 핵심 기술의 원형이 됐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실험은 칩 위에서 작동하는 양자 물리학을 드러냈다"며 "100년 된 양자역학이 계속해서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연구가 양자컴퓨터뿐 아니라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양자 센서 등 차세대 양자 기술 개발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올헤는 유엔이 지정한 '국제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물리학 관련 연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편 수상자들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 원)의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 받게 된다. 영국 케임브리지 태생인 클라크 교수는 초전도양자간섭장치(SQUID)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프랑스 파리 출신인 데보렛 교수는 회로 양자전기역학 분야를 개척했다. 마티니스 교수는 구글의 양자컴퓨터 팀을 이끌며 '양자 우월성'을 입증한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교사 사은의 밤 및 교육기금 후원의 밤 개최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또다른 전시회 연다
- "한인 여러분과 떠나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모네의 세계”
- 시애틀 한인들을 위한 특별재정 워크샵 열린다
- 한국 거장 감독 임순례, 시애틀 팬들과 깊이있는 만남(영상)
- 시애틀한국교육원 또 큰일 해냈다-UW과 대학생인턴십 위한 MOU체결
- 한인 줄리 강씨, 킹카운티 이민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합병 후에도 그대로 10년 더 쓴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10월 3일~10월 9일)
-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박노현교수 초청 문학특강 연다
- 시애틀 한인업체, 올해의 킹카운티 수출소기업상 받았다
- 한인 리아 암스트롱 장학금 올해도 16명에-23년간 54만9,000달러 전달
- 한인생활상담소 "미국 시민권 무료신청 해드립니다"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추석 ‘한가족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송편 만들기 등 성대한 추석행사 열어
- 상담소 "10월20일부터 바뀌는 시민권시험 이것은 아셔야"
- <속보> 故이시복 목사 돕기 모금액 1만4,000달러 넘어서
- 린우드 한식당 아리랑2.0, 추석패키지 50개 한정 판매한다
- 서북미문인협회 소속 김지현씨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 시애틀 한인 여대생, 미국 대통령 장학생 최종 선발 화제
- [시애틀 재테크이야기] 띠리리 리리리~~ 영구 없다
시애틀 뉴스
- 시혹스 막판 어이없는 실수로 탬파베이에 패배
- 시애틀 플레이오프 홈서 1승1패로 다시 원점에서
- 워싱턴주 더이상 ‘안전한 주’아니다
- 시애틀 '빈방 나눠쓰기'로 집값·홈리스 문제 풀 수 있을까
- 시애틀 여성 과학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했다
- 보험료 너무 비싸 시애틀 중산층도 무보험 전락
- 시애틀 편의점서 아이스크림·맥주 훔치고 개줄로 직원 폭행
- 오리건 포틀랜드 정치적 갈등에 중심에 서다
- 긱하버 보석 ‘S하우스’ 75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 시애틀지역 배송업체기사가 우편배달부에 총격
- 알래스카항공, 매리너스 팬들 원정 응원 위해 특별항공편 제공
- 시애틀 최고 식당, 이젠 어떤 방향으로 가나?
- 스타벅스 시애틀명소 리저브 로스터리까지 폐점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