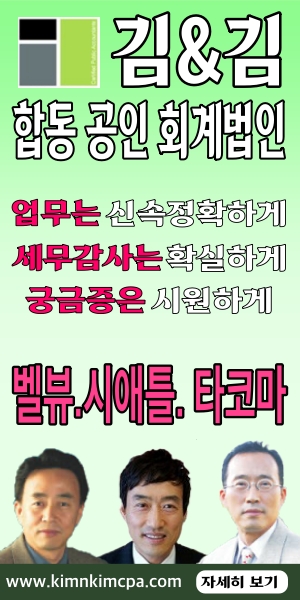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100세건강] “극심한 피로, 콜라색 소변…당장 병원 검사 받아야”
- 24-12-11
국내 500여명 앓고 있는 희귀질환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환자들 중간 연령대 36세…몸속 혈액공급 막아 생명 위협
상당수의 현대인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그런데 평소보다 피로가 심해지거나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면 희귀질환의 일종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은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혈액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1~1.5명 정도에서 드물게 발생한다. 서구 국가보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국내 환자 수는 2010년 260명에서 지난해 504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병이 생기는 환자들의 중간 연령대는 36세로 알려져 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주 특징은 적혈구가 파괴돼 주변 혈액으로 흘러드는 용혈이란 현상이다. 이로 인해 몸속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적혈구에 유전적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외부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혈관 내 용혈(IVH·Intravascular Hemolysis)과 혈관 외 용혈(EVH·Extravascular Hemolysis)이 발생한다.
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은 빈혈과 만성적 피로를 유발해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혈전증이나 골수기능부전까지 발생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이라고 소개했다.
고영일 교수는 "질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현대인이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평소보다 피로감이 극심해지거나 콜라 색 소변을 보는 등 이상이 감지되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표준치료법으로 'C5 억제제'가 사용된다. C5 억제제는 보체 단백질 'C5'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물로 용혈 조절 일부에서 일정한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약물 기전의 한계로 미충족 수요가 남아있다.
C5 억제제는 병이 진행되는 보체 시스템의 말단, 즉 끝부분에서만 작용한다. 따라서 혈관 내 용혈(IVH)은 조절하지만, 혈관 외 용혈(EVH)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온전히 조절되지 않는 용혈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C5 억제제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수혈에 추가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지속적인 빈혈로 최대 32%는 수혈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최대 89%는 피로 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피로는 환자 삶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C5 억제제는 2주에서 8주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해 정맥주사로 투입해야 한다. 병원 이동 시간과 실제 주사를 주입하는 시간, 주사 이후 회복 시간까지 모두 더하면 한번 치료에 240~3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제가 국내에 허가됐다. 이 약(입타코판)은 보체 시스템 내 B인자를 억제해 보다 근본적으로 용혈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다.
대체 경로의 근위, 즉 상위에서 작용함으로써 혈관 내 용혈(IVH)과 혈관 외 용혈(EVH) 모두를 조절한다. B인자를 억제하면 C5뿐만 아니라 C3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관 내외 모두에서 발생하는 용혈을 개선할 수 있다.

고 교수는 "기존의 C5 억제제는 표준 치료로 사용돼 왔다. 다만 혈관 밖에서 나타나는 용혈에는 약물의 작용 기전의 한계로 인해 조절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C5 억제제로 치료받더라도 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많게는 절반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B인자 억제제가 나왔다. B인자는 C5보다 상위 인자 개념이다. 따라서 B인자를 억제하면 혈관 내 용혈뿐 아니라 기존 조절이 어렵던 혈관 외 용혈까지 포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또 "국내에서도 B인자 억제제가 허가된 상황이지만 아직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환자에게 처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기존 표준 치료제의 미충족 요소가 개선된 치료 옵션이지만 접근성 개선이라는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민국 홍보대사인 국제결혼여성의 파워를 보여드립니다"
- 대형 아시안그로서리 체인 T&T 린우드점도 다음달 오픈
- 서북미한인학부모회, 주최한 아트 경연대회 올해도 성황
- 이성수 수필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한국 법무법인 성현과 협약 체결
- 타코마한인회 내년도 새 회장 뽑는다
- 저스틴 오군, 브라이트라이트스쿨 리더십상 및 장학금 수상
- [시애틀 재테크이야기] 오래 살 수 있는 이유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핑퐁 핑퐁
- [신앙칼럼-허정덕 목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 시애틀문학회 협회지 <시애틀문학>18집, 한국문인협회 ‘우수 문학지’로 선정
- 김필재 대표 이끄는 금마통운, 시애틀방문으로 새 도약 다짐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1일 토요산행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10월 10일~10월 16일)
- 샛별, 알래스카 앵커리지서 개천절 축하공연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올해 으뜸봉사상 시상식 열어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 US메트로뱅크,SBA 대출실적 두배 이상 증가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연회비 올렸는데도 고객들 충성도 ‘변함없다’
- 영주권 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걸렸다
- 시애틀 매리너스 사상 첫 월드시리즈 원점으로
- ‘홈런 5방 허용’ 시애틀 매리너스, 토론토에 4-13 완패
- 대형 아시안그로서리 체인 T&T 린우드점도 다음달 오픈
- 태풍 알래스카 외딴 마을 초토화시켰다
- 알래스카항공 승객 난동으로 긴급 착륙했다
- 아마존, 연말 앞두고 25만명 대규모 채용… “시간당 최대 30달러”
- 워싱턴주 첫 서리… 본격적인 가을 추위 시작
- 시애틀 매리너스 선수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각오
- 경찰 총격으로 부상 입은 타코마 남성에 175만달러 합의금
- 美국토안보장관, 공항들에 "셧다운 민주당 탓" 영상 틀려다 퇴짜
- 시애틀 매리너스, 적지서 ALCS 2연승…첫 월드시리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