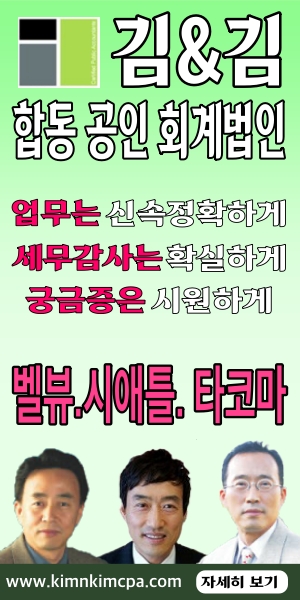금값 폭등에 유럽 박물관 황금유물 털렸다
- 25-10-07
네덜란드선 폭약, 파리선 사이버공격…대담해지는 범죄 수법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럽의 박물관들이 황금 유물을 노리는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영국 웨일스의 세인트 페이건스 국립 역사박물관에 2인조 도둑이 침입해 청동기 시대 황금 장신구를 훔쳐 달아났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60만 유로(약 10억 원) 상당의 희귀 금 원석 표본들을 훔쳐 갔다.
범인들은 절단기와 가스 토치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해 방탄유리를 뚫었다. 박물관 측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완벽하게 아는 전문가팀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특히 이 박물관은 범행 두 달 전인 7월 사이버공격으로 경보 및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된 적이 있어 보안 공백이 범행의 빌미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월 네덜란드 드렌츠 박물관에서는 절도범들이 폭발물로 문을 부수고 침입해 루마니아 국보급 유물인 '코토페네슈티의 황금 투구' 등 600만 유로(약 88억 원) 상당의 유물 4점을 훔쳐 갔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3분이었다.
이 사건으로 유물을 대여해 준 루마니아 국립 역사 박물관장이 해임되고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당시 박물관에는 야간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의 동기가 유물의 역사적 가치가 아닌 치솟는 금값에 있다고 지적한다. 도난당한 유물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암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렵기에 범인들이 유물을 녹여 금괴로 만들어 팔아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측은 "희소성이 있어 유통하기 어려운 문화재보다 바로 녹여버릴 수 있는 금이 (범인들에게) 훨씬 나은 선택일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루마니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코토페네슈티의 황금 투구'가 녹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루마니아 국민들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절도는 유럽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다. 이는 수백 년 된 낡은 건물과 느슨한 보안 시스템 탓이 크다. 2010년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 5점이 도난당했을 당시 경보시스템은 두 달 넘게 고장 난 상태였고 경비원 3명은 외부인 침입 사실조차 몰랐다. 최근에는 물리적 보안 문제에 더해 사이버공격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등장했다.
잇따른 도난 사건에 유럽 각국 경찰은 인터폴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박물관들은 뒤늦게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도난당한 예술품의 평균 회수율은 5~10%에 불과해 황금 유물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금 시세는 온스당 약 3971.4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한때는 3977달러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교사 사은의 밤 및 교육기금 후원의 밤 개최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또다른 전시회 연다
- "한인 여러분과 떠나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모네의 세계”
- 시애틀 한인들을 위한 특별재정 워크샵 열린다
- 한국 거장 감독 임순례, 시애틀 팬들과 깊이있는 만남(영상)
- 시애틀한국교육원 또 큰일 해냈다-UW과 대학생인턴십 위한 MOU체결
- 한인 줄리 강씨, 킹카운티 이민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합병 후에도 그대로 10년 더 쓴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10월 3일~10월 9일)
-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박노현교수 초청 문학특강 연다
- 시애틀 한인업체, 올해의 킹카운티 수출소기업상 받았다
- 한인 리아 암스트롱 장학금 올해도 16명에-23년간 54만9,000달러 전달
- 한인생활상담소 "미국 시민권 무료신청 해드립니다"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추석 ‘한가족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송편 만들기 등 성대한 추석행사 열어
- 상담소 "10월20일부터 바뀌는 시민권시험 이것은 아셔야"
- <속보> 故이시복 목사 돕기 모금액 1만4,000달러 넘어서
- 린우드 한식당 아리랑2.0, 추석패키지 50개 한정 판매한다
- 서북미문인협회 소속 김지현씨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 시애틀 한인 여대생, 미국 대통령 장학생 최종 선발 화제
- [시애틀 재테크이야기] 띠리리 리리리~~ 영구 없다
시애틀 뉴스
- 시혹스 막판 어이없는 실수로 탬파베이에 패배
- 시애틀 플레이오프 홈서 1승1패로 다시 원점에서
- 워싱턴주 더이상 ‘안전한 주’아니다
- 시애틀 '빈방 나눠쓰기'로 집값·홈리스 문제 풀 수 있을까
- 시애틀 여성 과학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했다
- 보험료 너무 비싸 시애틀 중산층도 무보험 전락
- 시애틀 편의점서 아이스크림·맥주 훔치고 개줄로 직원 폭행
- 오리건 포틀랜드 정치적 갈등에 중심에 서다
- 긱하버 보석 ‘S하우스’ 75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 시애틀지역 배송업체기사가 우편배달부에 총격
- 알래스카항공, 매리너스 팬들 원정 응원 위해 특별항공편 제공
- 시애틀 최고 식당, 이젠 어떤 방향으로 가나?
- 스타벅스 시애틀명소 리저브 로스터리까지 폐점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