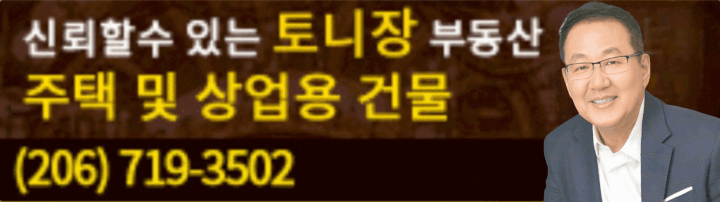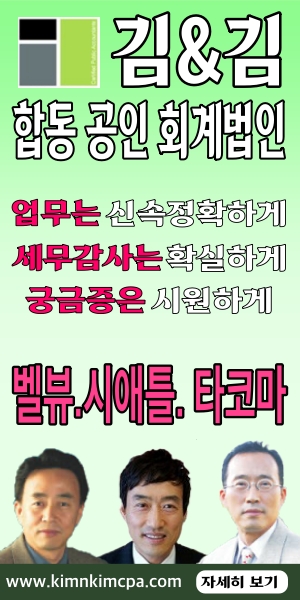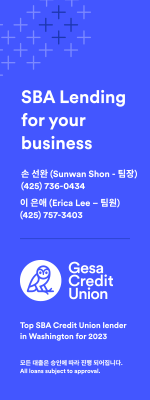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유세진] 신조어 나들이
- 22-08-22
유세진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신조어 나들이*
밈? 신문 기사를 읽다가 낯선 단어 하나에 눈길이 갔다. 또 다른 신조어가 유행하나, 궁금증 전구에 불이 켜진다.
언제부터인가 한글을 읽다가도 국어사전이나 구글 검색을 자꾸 열고 있다. 학창 시절 영어 독해를 할 때처럼 한글을 읽는데 사전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모국어가 외국어로 변해 가는 기분이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사전을 찾으면서까지 일일이 알려고 했을까? 영어가 모국어가 될 수 없다는 건 진작에 인정했지만, 한글이 점점 외국어가 되어가는 신세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서글프다. 그래서 새로운 어휘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애꿎은 이민살이의 집착을 부린다.
길바닥에서 동전이라도 주운 아이처럼, 요걸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까 꾸러기 표정을 하고 검색창에 '밈'이라고 쳤다.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은 국어사전을 먼저 펼친다. 주운 돈을 써도 되는지 엄마에게 허락받는 절차인 셈이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라면, 신조어든 외래어든 줄임말이든 한두 푼이 아쉬운 나에겐 모두 다 우리말로 적립된다.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문방구로 향하는 꼬마의 마음이랄까. 인터넷 뉴스에서 건진 새 단어로 쌈박한 글 하나와 맞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설레발을 떨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상은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었다. 단어 뜻을 알려 준 곳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영어사전이다.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인 거다. 게다가 신조어이기는커녕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미 존재한 단어다. 1976년도에 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사회 문화적 개념으로 사용됐다. 오랫동안 내 책장 한쪽에 버젓이 꽂혀 있던 책이기에 더욱 민망했다. lol이나 OTL처럼 meme은 어떤 인터넷 약자일까 머리를 굴려본 게 계면쩍다. 한글이든 영어든 변화하는 언어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은 경박스러웠나 보다.
처음 기대와 사뭇 다른 종류의 단어란 사실이 나의 태도를 바꿨다. 포털 사이트로 옮겨 좀 더 여러모로 ‘밈’의 뜻을 살펴보니, 요즘 유행하는 짤방의 인터넷 용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인문학적 의미가 깊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모방과 같은 형태로 복제, 전달하는 매개체의 유형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니, 오래전 유행어 하나가 생각났다. 이렇게 깊은 뜻이!
심심풀이로 시작한 검색이 뜻밖의 교양과 지식으로 인도했다. 글쓰기라는 문화 콘텐츠를 배워가는 요즘, 모방과 창조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더 진지해질 필요를 느끼던 참이다. 모국어에 굶주린 허기를 불량식품으로 채우려 급급했던 나를 다시 가다듬는다. 그리고 수전 블랙모어의 <밈>이란 책을 독서목록에 올린다.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처럼 책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야겠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주 펼쳐본 그림책이 있다. 피터 H 레이놀즈의 <단어 수집가>에는 낱말을 모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고많은 것 중에 단어를 수집하는 아이가 특이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다. 높이 쌓인 말 상자를 옮기다가 그만 미끄러져 낱말종이가 온통 뒤죽박죽된 상황도 꼭 지금의 나 같다. 아이는 단어를 다시 주워 모으다가 생각지도 못한 시를 쓰게 되고 그 시로 노래를 부르고 위로를 건넨다. 그 뒤로 더 열심히 자기 생각과 감정, 꿈을 담은 말을 모은다. 그리고 바람 부는 어느 날 언덕에 올라, 세상으로 모두 날려 보낸다. 더는 말이 필요 없는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화면 속 아이의 행복이 마냥 부럽다. 산들바람 부는 오후를 나는 언제나 맞을 수 있으려나.
딸에게 ‘밈’이란 말 알아? 물었더니 어이없는 표정을 하며 이게 언제 적 말인데 모르냐고 되묻는다. 언어의 바다에 뒤늦게 놀러 나와 신대륙을 발견한 나의 희열이 요즘 애들에겐 오글거리나 보다. 그래 난 몰랐다. 아니 이제 알았다. 속으로 구시렁거리긴 했지만, 오늘의 나들이가 재미있었던 것만큼은 순순히 인정해야겠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MBC에서 방영 중인 <우리말 나들이>를 밈(meme)한 제목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뉴스포커스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 정부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