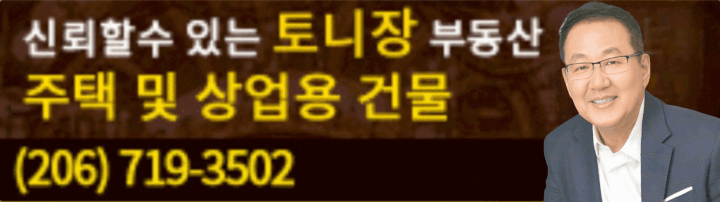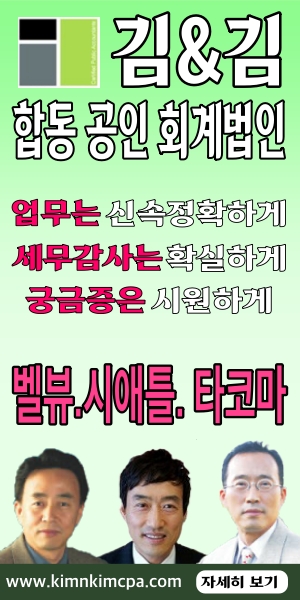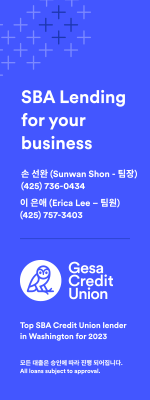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김윤선] 빅 트리(Big Tree)
- 23-10-16
김윤선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빅 트리(Big Tree)
고개를 한참이나 뒤로 젖혀서야 나무의 꼭대기가 보였다. 어림잡아 나이가 1500살이라는데 땅을 딛고 서 있는 장딴지가 여전히 탄탄했다. 286피트의 키와 74.5피트의 허리둘레를 가진 이 나무의 이름은 Big Tree, 레드우드 숲에서 산다. 인증샷을 하느라 발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곧추세웠는데 나무에 비하니 손가락 한 마디에도 미치지 않았다.
겉껍질 같은 건 부질없는 것이라며 훌훌 벗어버린 맨살에 드러난 굵은 주름이 작은 도랑을 이루었다. 묵은 옹이가 움푹움푹 패인 건 삶의 연륜이리라. 휘어진 곳 없이 쭉 뻗은 둥치가 어찌나 우람한지 과연 숲을 대표할 만했다. 빅 트리만큼 키 큰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출중한 외모가 한몫하는 건 어느 세상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멀리서 가까이서 사진 몇 장을 찍어봐도 나무를 온전히 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냥 눈에 담기로 했다. 찬찬히 더듬으니 아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 더부살이 나뭇가지였다. 처음엔 옆에 있던 나뭇가지가 빅 트리에 팔을 걸쳐 놓았나 했다. 아니었다. 둥치에 웬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제 이파리와 다른 게 적어도 두세 종류는 되는 듯했다.
옆으로 트레일 코스가 이어졌다. 키 큰 나무의 숲(Tall Tree Grove)이었다. 삶과 죽음이 한자리에 있었으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키운 것도 있었다. 나무 밑둥치가 동굴처럼 뻥 뚫린 것도 있고, 뿌리가 서로 닿아 한 몸이 된 것도 있었으며, 불에 탄 듯 속이 시커먼 흉터를 지닌 것도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자랐건만 모양새가 제각각이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아롱이다롱이라더니 그렇다. 숲이 형성된 지 1500여 년, 그곳엔 마치 고대가 숨 쉬는 듯했다.
발바닥에 닿는 촉감이 숲의 속살을 밟는 듯 폭신폭신했다. 피톤치트 때문인지 기분이 상쾌해졌다. 장난기가 돌았다. 속이 뻥 뚫린 나무의 빈 둥치에 들어가 원시인의 흉내를 내고 곰이 되어 겨울잠 자는 시늉을 했다. 아, 나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트레일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빅 트리 앞에 섰다. 나무는 왜 저렇게 키를 키웠을까. 그리고 제 혈육도 아닌 걸 왜 품었을까. ‘잭과 콩나무’ 동화가 생각났다. 마법의 콩을 심은 잭이 콩나무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빅 트리도 그러고 싶었을까. 갈매기 조나단처럼 먼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 눈 아래 내려다뵈는 숲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의 팔에 다른 수종의 씨를 안은 건 사랑이었을까, 연민이었을까. 무엇보다 그의 기나긴 삶은 축복이었을까, 형벌이었을까.
아흔을 넘긴 어머니는 매일 밤 죽음을 기다린다. 이제 삶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하신다. 아버지 생전에 버릇처럼 다음 생에선 절대 만나지 말자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먼저 떠난 아버지가 왜 당신을 데리러 오지 않느냐고 성화다. 어릴 때 동무들도 저승에서 저들끼리 노느라 당신을 잊은 모양이라며 못내 서운해한다. 부지런히 걷던 아침 산책도 이즈음 그만뒀다. 어떤 말도 어머니의 삶에 의욕을 불어넣지 못한다. 어머니의 기력이 나날이 쇠잔하다.
얼마 전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가 죽을 즈음엔 수명이 120세란다.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살 수도 있고. 그 말에 동감했다. 장수長壽가 재수 없음이 되어버린 인간 세상, 나무의 1500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나무의 올곧은 자세가 마치 명상에 든 모습 같아서 다른 수종의 나무를 품은 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어쩜 장수한다는 건 이미 무념무상의 경지일까, 아니면 무장무애한 성품 탓일까. 너나없는 이파리들이 제 어미 품에 안긴 양 편안해 보인다.
남편이 빅 트리 전신사진을 보여준다. 하늘에 닿은 듯한 나무꼭대기에서 이파리들이 이마를 맞닿은 채 반짝인다. 굵은 허리둘레만큼이나 나무의 넓은 품이 그려진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뉴스포커스
- '올림픽 진출 실패'에 고개 숙인 황선홍, 'A대표팀 내정설'에는 격앙
- 첫 영수회담…고물가·의료대란에 지친 시민들 "민생, 또 민생"
- "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검찰 송치…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