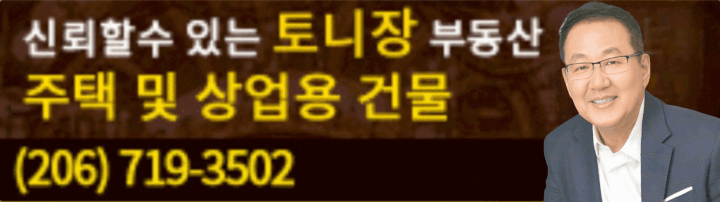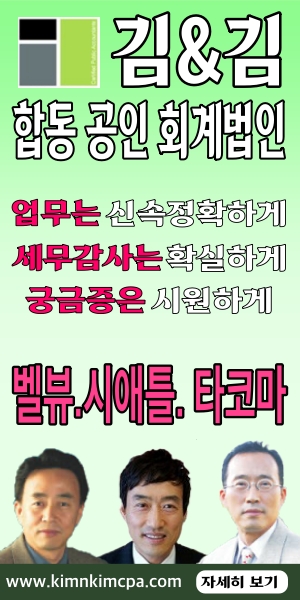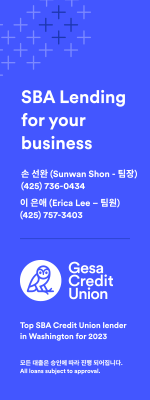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이대로] 다방
- 21-11-10
이대로(서북미문인협회 회원)
다방
한동안 지금의 카페 대신 다방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기 전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의 시기에는 서울에도 다방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방은 큰 사업이었고 주 상품은 차와 커피, 그리고 우유였다. 커피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맥스웰’이고 맥스웰은 커피의 대명사였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커피는 한 가지였고 맛도 그냥 씁쓸하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다방에서 커피 마시는 것이 신세대의 낭만이고 사교 방식이 되어 있었다. 제한된 재료에서 더 많은 커피를 뽑아 내기 위해 담배꽁초를 사용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생산량이 아주 적었던 우유는 다방에서 파는 고급 음료로 취급되었다. 날계란 하나 깨 넣은 뜨뜻한 우유 한 컵은 최고 단골 만의 특별 메뉴였다.
땡전 한 푼 없는 청소년들이 겉 폼 잡느라고 다방엘 가보긴 하지만, 제일 값싼 엽차 한 잔 시켜 놓고 시간 보내다가 눈총받기가 일쑤였다.
지금도 관광객이 많은 시골 읍내에는 가끔 유적처럼 남아있는 다방 간판을 볼 수 있다. 옛 향수를 달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고향도 찾아봤다. 추억이 박혀 있는 초등학교도 읍내에 있는 중학교도 둘러보았다. 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아득한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길은 더 넓어지지 않았고 한가운데 분수대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주위 모습은 몰라보게 많이 변해 있었다. 우체국도 사진관도 중국음식점도 찐빵 가게도 볼 수가 없었다.
달라진 모습에 불평도 못 한 채 계속해서 둘러보다가 아직도 그 자리에 걸려있는 다방 간판을 보았다. 장터로 향하는 길모퉁이에 길목이 좋은 장소다. 왠지 모르게 스며드는 짜릿한 정을 느끼며 이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았다. 층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서 오시라는 종업원의 인사말처럼 정겨웠다.
공간도 널찍하고 손님 좌석이나 카운터도 말쑥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식탁이 눈을 자극했다. 다른 모습은 많이 바뀌었으나 그 테이블만은 반세기 전의 그 자리인 것이 틀림없었다.
엄마 따라 장에 가면 장터 국수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뚜렷하다. 자장면은 비싸서 못 먹었다. 그때 중국 자장면 가게가 이 다방 아래층에 있었다.
서울에서 주경야독으로 학교에 다녔다. 고향을 떠나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커피를 사드렸던 자리다. 어머니는 맛을 모르겠다면서도 자장면 입가심으론 괜찮은 것 같다고 에둘러 좋게 평했다. 창밖 멀리 보이는 이웃집 장독대도 그대로였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썰렁한 느낌마저 들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벽 한 편에 커다란 안내문 같은 것이 있어 다가가 보았다.
영업은 하지 않으나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반가움의 인사라며 자동판매기의 커피와 고로쇠 약수, 그리고 산수유를 무료로 그냥 즐기라는 내용이었다. 고향의 짙은 인정이 시큰하도록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고로쇠 약수 한 컵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체온이 전해왔다.
수십 년을 우려낸 고향의 정을 가슴에 품고 나오면서 간판 밑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나이가 더 해지면서 건망증도 심해지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느낀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별 가치 없는 일이라도 오래된 일일수록, 마치 단단한 돌에 깊이 새겨 놓은 것처럼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고향의 추억이 바로 그 증거인가 보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온갖 고난과 풍파에도 바래지 않고 더 뚜렷하게 남아있으니 말이다. 그때 그 고향 다방이 눈에 선하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