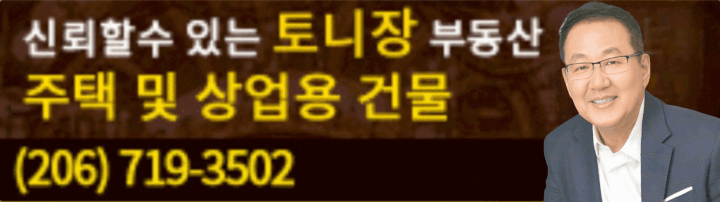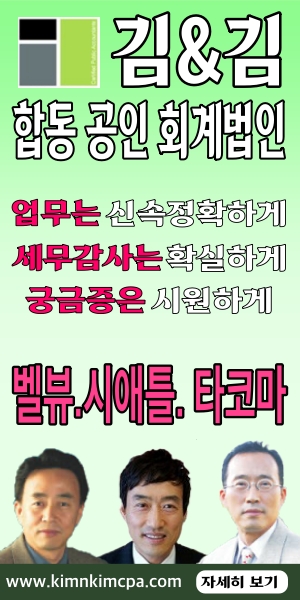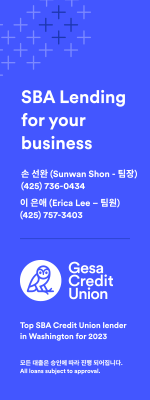코로나 치료비가 134만달러억?…생존자 두번 울리는 막대한 청구서
- 21-02-09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청구서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LA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의사조차 생존을 장담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끝내 완치됐음에도 이후 청구된 치료비에 또다시 고민에 빠진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패트리샤 메이슨(51)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3월22일 처음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다. 두 차례 전화 진료로 독감, 기관지염이라는 오진을 두 차례나 받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낫지 않아 결국 그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지만 메이슨을 제외한 가족들의 병원 출입이 제한됐다. 혼자서 병원에 들어간 메이슨은 그날 자정께 남편에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다음날에야 의사로부터 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메이슨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생존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가까이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메이슨은 다행히 회복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는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에 경악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133만9181달러(약 15억원).
다행히 남편의 회사 보험을 통해 대부분 금액을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약 4만2000달러가 본인 부담금으로 남아 있다.
메이슨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는건 알겠지만 현실은 돈이 정말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LA타임스는 미국의 많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자발적인 조치인데다 대다수는 이미 치료비 면제 정책을 만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건강보험계획(AHIP) 웹사이트에 등재된 의료 보험사 150개 중 46%는 치료비를 단 한 번도 면제해 주지 않았거나 면제 조치를 이미 만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보험자의 의료비 청구서의 경우 연방 정부가 부담하지만 병원들이 반드시 병원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연방 정부는 본인 부담 최대한도액(out-of-pocket maximum)에 상한선을 두어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최대한도액 상한선이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만6300달러이던 본인 부담 최대한도액은 올해 1만7100달러로 올랐다.
LA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이후 미국 전체 성인의 19%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삭감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까지 타격을 입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뉴스포커스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 대응"
- 김호중 마약 검사 받았다…"간이검사 음성, 국과수 정밀 의뢰"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9만명 투약분 마약 화장품통에 숨겨 반입한 유통조직 적발
- 출국 당일 '여권 영문명' 틀려서 허탕 치는 일 없어진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