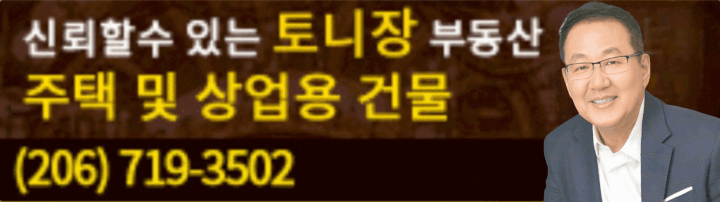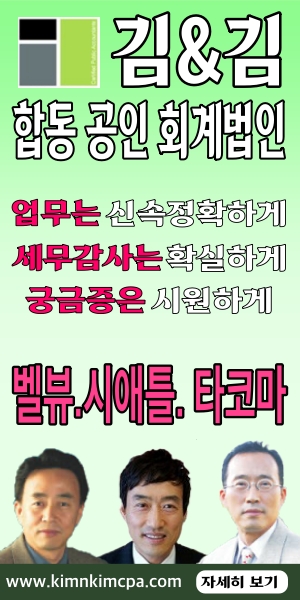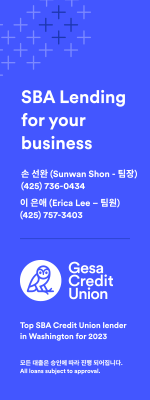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이대로] 봄비
- 23-02-13
이대로 수필가(서북미문인협회 회원)
봄비
퍽하며 칼날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악~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에 이빨이 먼저 입술을 깨물어 버렸다. 그리고 소리 나지 않게 큰 소리로 외쳤다. ‘죽는 건 겁나지 않지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다.’
반사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삽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눈을 떴을 때는 악몽이 지나간 후였다. 총알같이 날아온 쇠꼬챙이는 삽 앞판을 찍었고 끝이 우그러졌다. 그때의 반동으로 삽 뒤판은 어머니의 이마를 때렸다. 우그러진 끝마디가 빠져나가면서 가마니를 찢었다. 주먹만한 구멍 사이로 하늘이 내다보였다.
6ㆍ25전쟁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힌 인민군은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공비가 되었다. 밤이면 산자락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약탈하고 주민을 인질삼았다. 지서를 습격하여 불태웠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 고향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형적인 산촌이었다. 뒤에는 지리산이 병풍을 두루고 확 트인 앞마당 건너편에 굽이치는 섬진강에서는 잉어가 다이빙한다. 화엄사 뒷산에는 각종 버섯이 전시장을 이루고 물 맑기로 이름난 청내에는 돌멩이 밑마다 가재가 득실거린다.
전쟁 통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잃은 어머니는 얼떨결에 슬픈 가장이 되었다. 자식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강박감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9살과 5살짜리 두 아들은 걸리고 갓 돌 지난 쌍둥이 두 딸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아야 했다.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기차역까지 세 시간 반을 걸었다.
작은할머니 친정이 있는 남쪽 항구 여수로 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어려움은 그냥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지고 갔던 돈과 양식이 다 떨어지니, 공비만 없다 뿐이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린 가장은 어려운 결정을 했다. 위험해서 떠나왔던 그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죽을 작정하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앞섰다. 식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길가에서 구걸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여수까지 한 트럭 짐을 싣고 오려면 순천을 거쳐야 하고 소련 재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공비는 그곳에도 나타나서 물건과 사람을 약탈했다.
죽을 각오로 적지에 들어가서 지은 농산물이다. 자식들을 살려야 하는 생명수다. 피난민 보따리로 위장하고 어머니는 그 속에 숨었다. 공비들은 총검으로 가마니마다 찌르기 시작했다. 그 찌른 칼끝이 어머니 코앞에까지 들어왔을 때 정신은 이미 얼어버렸다. 겁에 질린 외마디 외침이 나오려 하자 이빨로 입술을 깨물어 버렸다. 자식들만은 살려야 한다. 어머니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자동 반사작용으로 이빨이 작동되었고 총검에 수없이 찔린 곡식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날카로운 매 발톱에, 어미 닭은 털이 뽑히고 살이 긁히고 피가 흘러도 병아리를 지켰다. 살아 돌아온 곡식 앞에서 형이 위로한답시고 죄송하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죄송하긴 내가 미안하다.”
제법 성숙한 척하느라고, 언제 효도한대요? 라고 탄식하는 나의 슬퍼 보이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잘 자라는 게 효도여!”
어머니의 가슴은 용광로다. 그 열기에 총검도 휘었다. 난리 속에 파묻혀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씨앗은 그 열기로 살았고 싹을 피웠다. 큰 나무가 되었다.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손주 다섯이 마구 흔들어 대면 피곤하다가도 마냥 즐거워지는 고목이 되어가고 있다.
80년 인생길 굽이굽이마다 살을 에는 북풍한설도 있었다. 그 길목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얻곤 했다. 봄비는 어머니의 땀이다. 봄비가 내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에 젖는다. 나도 용광로의 땔감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존하고 싶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 한국 AI플랫폼 와이즈에이아이, 시애틀 정은구치과와 MOU
- 이번 주말 SNU포럼, 주제는 ‘사우디의 추억과 이슬람문화 이해’
- 평통 시애틀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연다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항공 1시간동안 전면 이륙 중단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 워싱턴 주민들 "주택 더 많이 지어도 집값 안떨어진다"
- 워싱턴주 명소 로자리오 리조트 영업 일부재개
- 워싱턴, 오리건 등 서북미 전력대책 암울하다
- 시애틀에서 집 사려면 얼마 벌어야할까?
뉴스포커스
- 5월부터 '진짜 엔데믹'…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
- 서울 아파트값 제자리인데…압구정 80억, 성수 57억 '신고가'
- 정부, '독도 억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시정 촉구"
- 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 '증원 축소' 국립대 '동참' 사립대 '관망'…'증원 고수' 대학도
- 윤 대통령-이 대표, 취임후 첫 회담 성사…"국정 논의하자"
- 국립의대 모집인원 자율조정 허용…한 총리, 오후 발표
- 5·18추념일에 광주서 트로트 콘서트…시기 적절성 논란
- "죽일까?" "그래" 파주 호텔 여성 2명 살해한 남성들 메신저 확인
- "푸바오, 잘 먹고 잘 놀아요"…국내 팬들 안심할 중국생활 근황
- 복귀조건 내건 전공의, ‘반대’ 의견 못 참는 의협…꼬이는 대화
- 농촌왕진버스 시작부터 '삐걱'…1회당 2400만원인데 예산 마련 아직
- "갑자기 천만원 결제?" 가짜 쇼핑몰로 결제 유도하는 '이커머스 피싱' 기승
- "고물가에 이젠 그렇게 비싸지 않아"…부활 시작된 패밀리레스토랑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