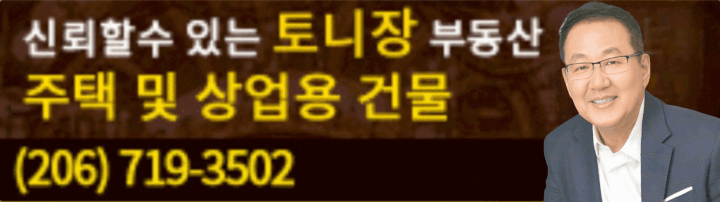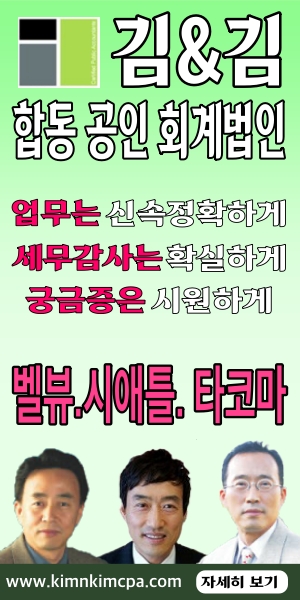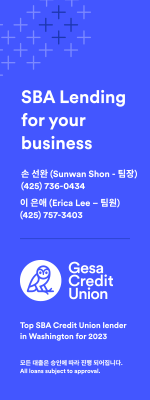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신년 수필-최은희] 라떼는 말이야
- 23-01-02
최은희(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멈칫 조심스러워진다. 그 말이 나만 옳다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어른들의 꼰대질로 치환되어 부정적 의미로 쓰인단 사실을 알고 부터였다. 사사건건 지적하는 어른들을 비아냥대고 비꼬는 신조어라고 한다. 그들만의 은어로 약간 비틀어 사용하다 보니 '나 때'가 '라떼'로 변한 셈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노인이 버릇처럼 지나간 시간을 언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서두가 그 말인 걸, 소위 내가 기성세대로 편입되고 나니 불편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저 부질없는 하소연일 텐데 그조차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니 말이다. 당신들과는 한마디도 나눌 수 없으니 첫마디조차 내뱉지 말란 소통을 거부하는 단어 선택이 몹시 씁쓸하다. 그래서 무심코 터져 나오려는 그 말에 입막음하느라 바쁘다.
세대 갈등, 분명히 있을 법한데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존재였다. 언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 정작 기성세대들은 알지 못한다. 스마트 폰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그들만의 놀이 공간에서 구세대를 맘껏 조롱한들 어찌 알겠는가? 귀를 활짝 열고 할머니에게 옛날얘기를 졸랐던 우리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옛날 옛적에'하고 시작되는 이야기는 빼곡히 쟁여져 쌓인 장엄한 시간 속, 어느 한 매듭을 풀어 헤치려 시작하는 말이었다. 유구한 세월의 흔적으로 쓰러져가는 폐가와 어우러져 이끼 낀 고목들이 딸려 나온다. 그냥 빛바랜 사진첩이 되어 세월 따라 흘러가는 회색빛 과거가 머물러 있다.
영겁의 침묵만이 존재하는 신의 공간, 다가갈 수 없는 심연. 이렇게 세월은 모든 걸 변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한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생기 가득했던 그 시간은 달빛 아래 처연히 물드는 전설이 되었다. 할머니의 할머니 그 이야기 속의 시간은 더디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 되어 오지 곳곳까지 미세한 그물망으로 연결된 사이버 세계는 세월을 뛰어넘고 세상을 넘나든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가능한 세상, 햄버거 커피가 나오고 사랑도 나온다. 날카롭게 상처를 내고 때론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지막지한 칼날이 되기도 한다.
태양 아래 찬연히 빛나는 현재는 숨 가쁜 세상이다. 팽팽 돌아가는 중심에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애쓰지만 역부족이다. 그 몇 번의 클릭이 어려워 점점 옆으로 밀려나 어느새 한 귀퉁이에 비켜 서 있다.
굼뜨고 더딘 육체를 가진 지금에서야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옛날 옛적 이야기, 이제는 얼마든지 들어 줄 수 있는데 예전 말하던 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내 말을 들어 줄 이는 귀 막고 서로 다른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간다. 도돌이표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며 대물림되는 인생의 한 단면이겠지.
고리타분한 넋두리로 여겨졌다. 예전에 부모에게 했던 무심하고 성의 없던 행동들은 그래서였다. 부모의 나이가 된 지금, 업보처럼 고스란히 내게도 닥치니 이젠 알겠다. 사람이 사람을 추억하는 버릇이다. 사람이 사람과의 인연을 반추하는 버릇이다. 그래서 같이했던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그리움이 되고 추억이 되는 이 나약함, 나이가 들수록 지독해지는 고질병이다.
아뿔싸! 이렇게 또 주저리주저리 '라떼는 말이야'를 풀어 놓는다. 결국 나도 못 말리는 꼰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대들은 알까? 한겨울 눈 내리는 가운데 서서 유월의 빨간 장미를 생각한다고. 꿈꾸고 갈망했던 시간의 조각들이 서성일 때 우리도 늘 그 언저리에 머문다고.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라 않던가?
*푸시킨 <삶> 중의 한 구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시애틀 뉴스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 스타벅스, 4년 걸려 개발한 '일회용 컵'선보여
- 테슬라 미국서 모델Y 등 가격 2,000달러씩 인하
뉴스포커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 정부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 김건희 여사, 정상외교서도 비공개…영수회담으로 '정상화' 출구 찾을까
- "푸바오와 만나나" 질문에 中출장길 홍준표 "고향 간 판다 왜 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