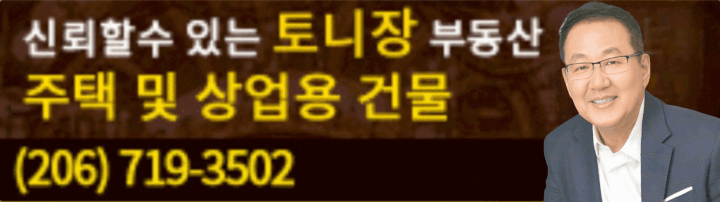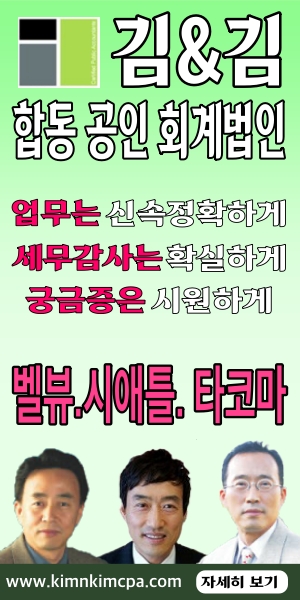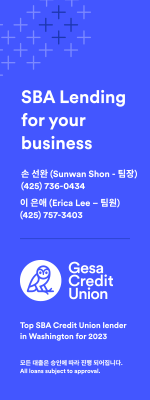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피플in포커스]한국계 미국인 이규성, 칼라일 떠난 진짜 속사정
- 22-08-30
"인생 너무 짧다." (Life's too short)
미국의 거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을 이끌던 한국계 미국인 이규성 전 최고경영자(CEO, 56)가 이달 초 70대 공동 창업주들에게 내뱉은 일성이다. 이틀 후 이 씨는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칼라일그룹의 주가는 6% 넘게 급락하며 시가총액 20억달러가 증발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창업주들의 복수: 월가의 세대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씨가 물러나게 된 내막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이 씨가 칼라일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을 놓고 창업주들과의 불화로 갑자기 사임했다고 전했다.
사모펀드의 알력다툼은 미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회사에 고용된 미국 근로자는 1200만명에 달해 전체 노동인구의 7%를 차지한다.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사모펀드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사모펀드 경영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원들을 압박했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윌리엄 콘웨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대니얼 다니엘로가 공동 설립했고 방위산업 분야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칼라일그룹은 회사 중심을 다음 세대로 넘겨 주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고 이 씨는 이러한 세대 전환의 일환이었다.
이 씨가 돌연 CEO에서 사임하면서 사모펀드의 창업 1세대가 젊은 지도자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완전히 넘기지 않고 여전히 제약을 가하는 현실이 재확인된 셈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 씨가 연금 펀드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오랜 경영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며 불화가 커졌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씨는 이들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백만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반대해 몇 사람이 회사를 떠났다.
또 이씨와 일부 경영진들은 루벤스타인 창업자의 가족회사가 개인자금 수백만달러를 투자해 직원들이 이익충돌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NYT는 쩐헀다.
그리고 지난 6월 이 씨는 뉴욕 맨해튼에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주최로 열린 저녁 모임에 참석해 과거 창업주들의 회사경영 방식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최고 수준이었던 칼라일이 너무 신중하고 느려서 뒤쳐졌다고 이 씨는 개탄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이 씨는 루벤스타인이 칼라일을 상징하는 얼굴처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씨는 칼라일그룹의 다른 이사들과 친분이 막역한 창업주들과 달리 상대적 아웃사이더(외부인)이었다. 이 씨의 비전은 칼라일그룹을 구식의 매수합병(바이아웃) 전문회사에서 벗어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 씨는 칼라일그룹의 투자 영역을 보험, 대출, 민간기술 투자 등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결과는 상당했지만 업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칼라일의 현재 운용자산은 3760억달러로 2017년 말에 비해 93% 늘었다. 하지만 다른 경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KKR이 같은 기간 불린 운용자산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또 칼라일 주가는 2017년 말 이후 2022년 7월 말까지 70% 올랐는데 KKR와 블랙스톤보다 상승률이 뒤처진다.
뉴욕주 올버니 출생의 이 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부모님 슬하에서 미국, 한국, 싱가포르를 오가며 자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컨설팅업체 맥킨지에서 잠깐 일하다가 다른 거대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에 합류했다.
워버그핀커스에서 20년 넘게 몸 담았던 이 씨는 2013년 칼라일로 넘어가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주들을 대신했다. 2017년 이 씨는 글렌 영킨과 함께 공동 CEO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창업주들은 이 씨에 대해 "결단력 있는 지도자이자 성공적인 투자자"라며 "전략적 사업건설자이며 창의적인 문제해결사"라고 극찬했다. 3년 후 영킨이 버지니아주 주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씨가 단독 CEO 자리를 맡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 스타벅스, 4년 걸려 개발한 '일회용 컵'선보여
- 테슬라 미국서 모델Y 등 가격 2,000달러씩 인하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사건 동영상 공개돼
뉴스포커스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 김건희 여사, 정상외교서도 비공개…영수회담으로 '정상화' 출구 찾을까
- "푸바오와 만나나" 질문에 中출장길 홍준표 "고향 간 판다 왜 집착?"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민주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드러나…채상병특검법 처리할 것"
-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저'…인구 52개월째 자연감소
- 서울대의대 교수들, 25일부터 개인 선택 따라 병원 떠난다
- 사직하는 교수, 휴진하는 교수…모레 '대학병원 셧다운' 현실 되나
-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고소 "강제추행 혐의…선우은숙 큰 충격받아 이혼 결심"
- 총선 사전투표소 40곳 불법카메라 유튜버 재판행…공무원 대화도 녹음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뿔난 MZ
- 사회 초년생 노려…순천서 아파트 218채 사들인 뒤 95억대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