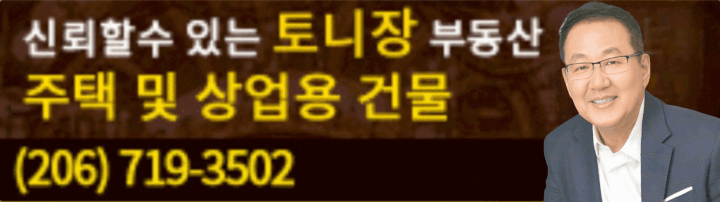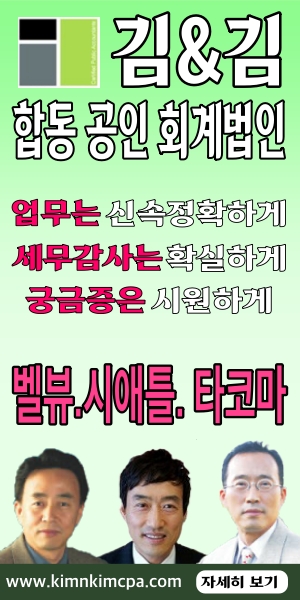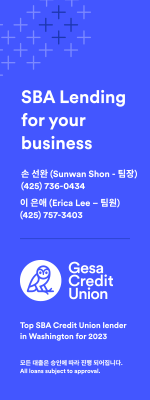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정동순] 다섯 가지의 질문
- 22-03-07
정동순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다섯 가지의 질문
알렉사,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 최저 기온 9도, 날씨는 맑아요. 알렉사, 독일어로 감자를 뭐라고 해? 카타 풋. 알렉사, 우체국은 오늘 몇 시까지 문 열어? 여섯 시까지요. 알렉사, 제프 베이조스는 왜 이혼했어? 그건 잘 몰라요. 알렉사, 왜 몰라? 실망이야. 미안해요. 앱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거실 탁자에 놓인 AI 알렉사(Alexa)와 질문 놀이를 한다. 알렉사는 심심할 때, 혹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요긴하다. 우리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내 영어를 잘 알아듣는다. 알렉사는 내 질문에 대답도 잘하지만 난처한 질문을 요령껏 회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 좀 싱거운 이야기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든 매일 다섯 가지 질문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다. 어떤 날은 알렉사를 귀찮게 해 그 목적을 조금 쉽게 달성하기도 한다.
“지금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 다섯 개를 써 보세요”
학기 초, 첫 시간에 학생들과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고 빨리 친해지려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잠시 생각한 후에 제법 진지하게 질문을 써나간다. 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신은 정말로 있을까?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뱀파이어는 있을까? 시간여행은 가능한 것일까? 비밀의 책은 있는 것일까? 암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왜 개는 흰색과 검은색만 볼 수 있을까? 왜 인간의 몸은 물이 필요할까? 하늘은 왜 파랄까?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다양한 질문이 나온다.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그 다섯 개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학생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파악된다.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There are no bad questions.”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는 말로 학생들을 다독인다.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학생이 뭔가 물어보면 교사들이 습관처럼 대답 앞에 붙이는 말이다. 질문하는 학생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이다.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시한 결과다.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일 힘든 경우는 학생이 질문하지 않고 다 모르겠다고 하는 때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사실 질문하는 학생은 이미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질문법은 예나 지금이나 우수한 교육법의 하나다. 질문을 잘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배우게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되기도 하고 수동적인 학습자로 전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교사 연수회에서 빠지지 않은 내용도 질문하는 방법이다.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어떤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끌어내느냐 하는 내용이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블룸(Bloom)의 분류법(Taxonomy)은 사고의 과정을 여섯 단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배울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질문은 내용에 대해 그저 기억하여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다. 다음 급은 ‘A는 무엇이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란 정답이 없을 때가 많다.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을 추론의 과정에서 근거를 대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보라는 명언이 있다. 산다는 것은 질문의 역사라고 갈파한 분도 있다.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도 답이 아닌 질문에 의해 방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선택을 달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선택을 달리하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은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포기, 또는 편함에의 안주, 혹은 더 이상의 진보를 포기하는 일이 아닐까? 왜 이렇지?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선택을 바꾸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다.
사람이 늙는 때는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배우지 않을 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있다. 질문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다. 다 안다는 자만 대신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질문은 관점을 새롭게 해 주고 타성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질문은 아직 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생각 끝에 다시 알렉사에게 묻는다. 조금 난도를 높여본다. 알렉사, 오늘은 나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알렉사가 아닌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언제쯤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생을 통찰하는 심오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전능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