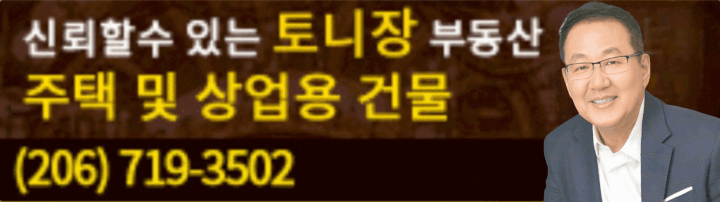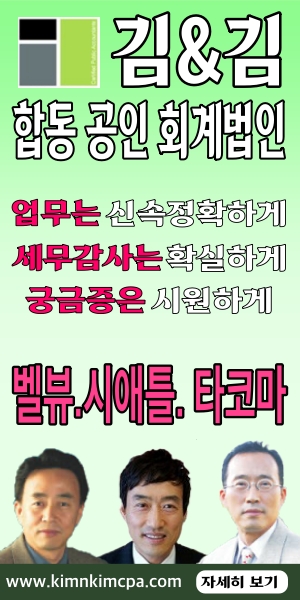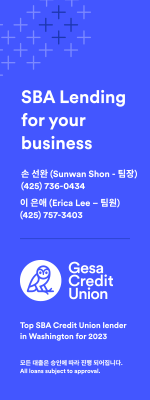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공순해] 시간, 너는 누구냐
- 22-02-21
공순해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시간, 너는 누구냐
최근 가장 가까운 분이 지병으로 작고하셨다. 그분은 평소 나를 부러워하셨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고. 나를 부러워하는 분도 있나… 돌아보면 서로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에 부러워한다. 대부분 결핍만을 헤아려보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성이 있다.
어차피 인간이 이룬 도시 문명은 상위만 바라보고 살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 허망한 위에 위로가 있을까. 그러기에 인간의 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게 아닐지.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아폴로호의 닐 암스트롱은 우주 첫발을 내디딘 순간 그래도 신은 계시다 했다. 그보다 먼저 도착했던 보스토크 1호의 유리 가가린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란 측근 비화(秘話)를 남겼다.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없으신 분.
문득 시간이 신이 아닐까, 란 데로 생각이 미친다. 마침 받은 365개의 선물 중 50개를 써버린 날이다. 새해만 맞으면 새롭게 살아볼 궁리를 하게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며 의지는 낡아버린 가구처럼 무용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란 존재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는 시점이기도 하다.
만일 시간이 신이라면 시간은 단선 궤도의 열차 같지 않을까. 기관사, 열차 지배인, 객실 담당 전무, 세 분이 협업하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시간을 지치지도 않고 운전해 가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매일 수고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시간 속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없으신 분이 맞는 게 아닐지.
그럼 그 열차는 어느 쪽으로 달리나. 지구가 동쪽으로 도니 동쪽으로 달리겠지. 지구는 왜 동쪽으로 도나. 첫 자식 카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의 거주지가 동쪽에 마련되어 있었다. 고로 역사도 동쪽으로 흐른다.
70년대에 문화 중심 이동 경로를 가르치며, 순서로 보면 맞지만 너무 작은 나라이기에 한국 차례가 올까, 반신반의했었다. 혹시 순서가 일본에서 한국을 그냥 건너뛰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조바심도 일었다. (탄허 스님은 지구 주축 부분에 위치한 한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리라 예언도 했다.) 그리고 유럽 중심의 문화가 미대륙으로, 태평양으로 건너 일본을 지나 바야흐로 한국이 중심이다. 다음 바통은 중국일 터. 중국의 패권이 지면 동남아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또한 이처럼 동쪽으로 흐른다.
돌고 도는 세계 문화 중심을 좀 더 한국에 머물게 하려면 지금 그 정점에 있는 BTS에게 좀 더 시간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들을 정점에서 일찍 내리게 해 군대에 보내게 되면 그 기운은 구멍난 풍선이 되어 문화 중심은 조속히 중국으로 가버릴 것이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순발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면 좋겠다.
이처럼 신은 인간을 동으로 동으로 돌며 살아가게 마련해 두셨다. 인간이 눈치 못 채고 있을 뿐 에덴동산도 동쪽을 향해 돌고 있다. 매일 79억 개의 에덴동산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마음속에서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에덴동산이기에.
불가에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한다. 요즘 물리학에선 이를 과학으로 입증한다. 모든 물질, 즉 존재는 빛의 반사로 맺히는 상이기에 그 안은 텅 비어 있다고. 그 어렵다고 하는 양자 역학이 바로 이것이라 하니 아무리 학설이 많아도 진리는 하나, ‘텅 빈 자유’인가.
생각이 벋어나가다 보니 신약에서 ‘그분이 오시는 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모든 물체가 녹아버려 땅 위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 한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란 상상에 미치게 된다. 텅 빈 허상(虛像)인 천체가 타버리고 시간이 사라진다면 만사는 종료(?)다.
지구 종말 100초 전이란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다. 강제 종료당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아닌 예감이 들기도 한다. 이미 두 차례 그분은 강제 종료를 집행하셨다. 회복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물과 불로 싹쓸이 소멸시키셨고, 한번은 유수(幽囚)로. 세 번째는 바이러스로? 아무튼 요즘은 삶이 낭떠러지로 속도를 내는 건지 새로운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 새 동력을 가동한 건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무섭게 붙는 속도에 몸서리가 난다.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삶이 가팔라져만 간다. 종말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고 죽었고 등으로 가르고 분리하는 것도 무의미하며, 실존도 허무의 반의어가 아니라 허무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닐지. 가까운 분을 잃어 자꾸 헐거워지는 심사를 이런 말로 눙쳐보며 그분과 작별을 마무리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