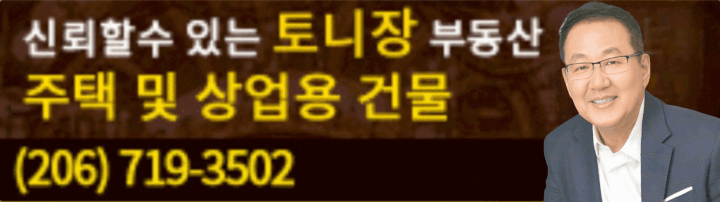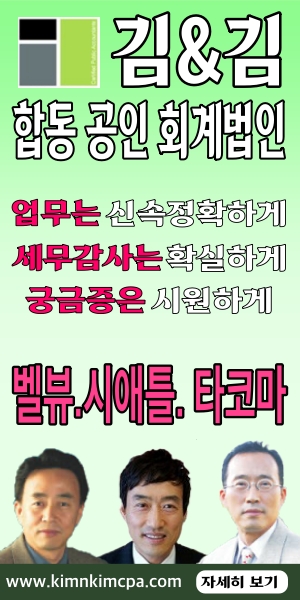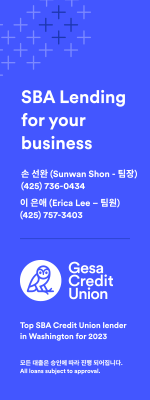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나의 식탐
- 21-12-13
이 에스더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나의 식탐
온몸의 세포들이 먼저 반겼다. 정겨운 분위기에 서른 가지가 넘는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한 상 가득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사뭇 진지하게 작성한 리스트 중 하나가 한정식집에 가는 것이었다. 십여 년 만에 고국을 찾은 나는 그날 그곳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열심히, 후회 없이, 실컷 먹었다. 옆에 있던 막내딸이 어이구, 엄마 뱃속에 동생이 들어 있네, 하는 바람에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먹을까. 우리는 구 남매다. 커다란 양푼에 담은 비빔밥을 가운데 두고 언니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먹으며, 나는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밥상에서 펼쳐지는 갖은 전략과 전술을 다 깨우쳤다. 요즘이야 밥상 병법 따위를 익힐 필요가 없는 세상인데도 음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살면서 위장이 더 커진 것 같다. 처음엔 미국 식당 음식의 엄청난 양에 기가 질렸는데, 지금은 살뜰히 다 먹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아메리카나이즈 되었다고 해야 하나. 마켓의 선반에 진열된 패키지를 보면 슈퍼, 메가, 자이언트라는 말을 붙여 음식의 부피와 양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포장에 쉐어 사이즈라고 적힌 초콜릿은 몸과 마음이 나눠 먹으라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의 식탐과 이를 자극하는 상술이 어우러져 세상이 과식과 폭식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간 내 위마저 자이언트 사이즈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식습관을 이르는 말 중에 미식, 탐식, 과식 등이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음식을 함께 먹기 때문이 아닐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먹는 데서 비롯된 걸 보면 식탐의 뿌리는 에덴동산 어디쯤에까지 닿아 있을 것 같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식탐을 칠죄종(七罪宗)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천주교인이었더라면 먹는 일로 인해 누구보다도 고해성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오래전 사극 드라마 <무신>의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느 날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엄마들이 마을에서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갓난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 까닭인즉 맛이 좋은 애저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유모(授乳母)들을 잡아다가 한 곳에 가둬놓고 새끼 돼지에게 사람 젖을 먹이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다. 또 한 가지, 고대 로마인 플리니우스는 돼지고기에서 무려 쉰 가지의 맛이 난다며 그 맛을 극찬했다니 도대체 그는 어떤 미감을 가졌을까. 그의 섬세한 미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숨탄것들의 희생과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그가 먹었던 음식에는 어쩐지 수많은 약자들의 뜨거운 눈물이 녹아있을 것만 같다.
몽골 유목민들은 양을 잡으면 먼저 피의 일부를 하늘에 뿌리며 음식을 허락한 신과 희생된 동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난 후에 요리해서 먹는다고 한다. 생명을 대하는 유목민들의 마음이 참 따스하다. 그들의 깨끗한 영혼이 미각의 충족만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베인 상처를 싸매 주는 것 같다. 누구나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세상 어디서나 천국의 식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뷔페식당엘 갔다. 운동장만 한 홀은 사람들과 음식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딴 세상 이야기인 듯 너나없이 행복한 표정이었다. 문득 순간의 식욕을 참지 못하고 죽 한 그릇에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가 떠올랐다. 에서처럼 먹는 것에 마음이 쏠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순간들이 나에겐 없었을까. 넘치도록 풍요로운 음식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올해도 식탁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냈다. 팬데믹 때문인지 감사절의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런데도 나는 감사를 헤아리기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식탁을 차리기에 더 분주했다. 그 와중에 며칠째 거북하던 속이 이제 좀 편해졌다. 소식(小食)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식탐을 다스리지 못해 탈이 나고 후회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욕심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라’는 음식에 대한 경구를 깊이 새기고 마음공부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음식이 내게로 온 먼 길을 헤아리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할 날이 언제쯤일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