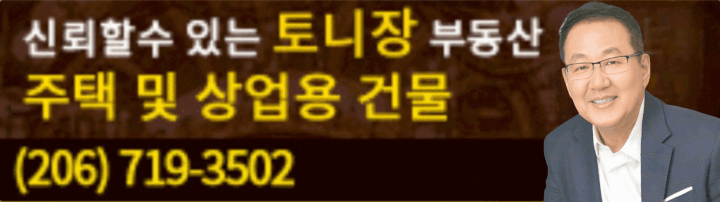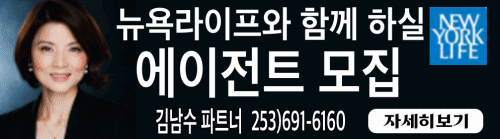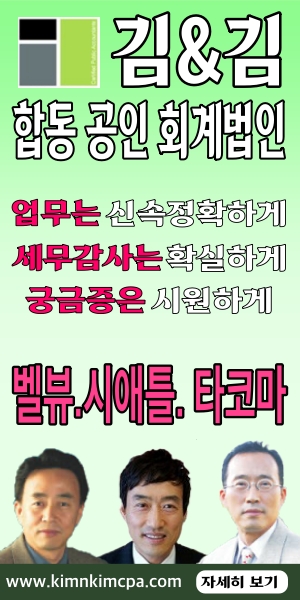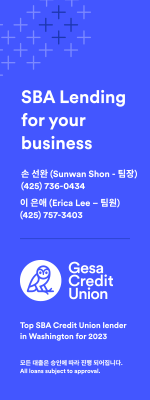대전 은행강도 사건 용의자 검거 결정적 증거는 '손수건'
- 22-08-29
경찰, 2018년 손수건서 DNA확보…유전자 기록없어 용의자 특정 못해
"자식시켜 잡자"던 집념 21년 만에 범인 검거…범인 추적 과정 등은 비공개
21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닌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현장에 흘린 손수건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 등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일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용의자를 특정한 경위에 대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이들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찰이 밝힌 DNA는 범행에 사용됐던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째인 지난 2018년, 이 손수건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지만 십수 년이 지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2016년, 대전경찰청 강력계에 김선영 계장(현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이 부임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계장은 이듬해 팀원 2명으로 운영되던 미제팀을 팀장 포함 4명으로 확대하고 은행 강도살인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둔산경찰서 압수물 보관소에 보관중인 수십 박스의 수사보고서와 십수 년째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대전경찰청으로 옮겼다.
증거물을 확인하던 한 형사가 손수건을 발견했다. 경찰은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분석을 의뢰했다.
몇달 뒤인 2018년, 국과수로부터 놀랄 만한 답변이 돌아왔다.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이었다. 당시 기술로는 검출할 수 없던 DNA를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해 찾아낸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선영 과장은 그 순간에 대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수사가 쉽게 풀린 것은 아니다. DNA정보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문과 달리 개인의 DNA정보는 범죄자 등에 한해 등록, 관리된다. 범죄자의 경우 DNA를 검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죗값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를 찾는데도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개인의 기초 DNA가 확보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은행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범행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질러 DNA가 등록돼 있었다면 범인을 특정하고 쉽게 검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과장은 당시에 대해 "미제팀과 수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DNA 주인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고 지문과 달리 DNA는 대조 자료가 없는 한 주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팀원들과 "최소 5년은 잡고 가자.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식을 경찰 시켜서라도 하자"라고 수사 의지를 다졌다고 회상했다. 용의자들은 김 과장의 예상보다 조금 빨리 경찰에 붙잡혔고 사건 수사를 대물림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어떻게 추적했는 지, 이들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9월 1일 그동안 수사 상황을 종합해 공개 설명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