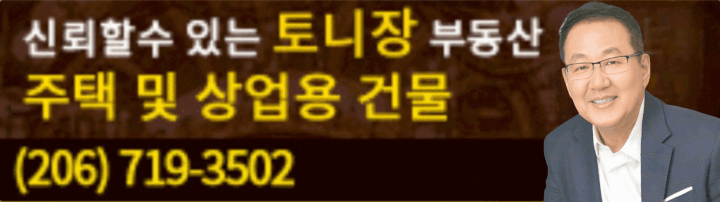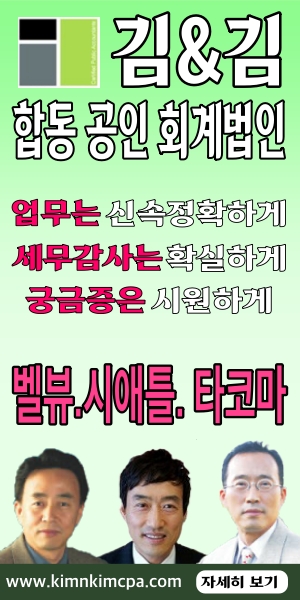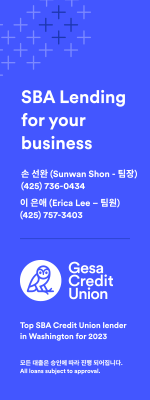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운전대 안잡고 씽씽'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EV9의 도전 시작
- 23-05-09
현대차그룹, 벤츠·혼다·볼보 이어 세계 4번째로 레벨3 상용화
속도 제한·높은 비용은 문턱…"전기차처럼 보조금 있다면 도움"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000270)의 신차 EV9에 '레벨3' 자율주행을 탑재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시대의 문을 열었다. 안전 문제로 속도 제한이 있고 비용도 다소 부담이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네번째로 레벨3 수준에 오르면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EV9은 국내 첫 대형 SUV 전기차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중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HDP)을 탑재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을 6단계(0~5)로 분류하는데, 자동으로 차선과 앞차 간격을 유지하는 레벨2 자율주행은 이미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상용화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레벨3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차'로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자율주행 선두주자로 테슬라를 떠올리지만, 사실 테슬라는 아직 레벨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 수준으로는 레벨2와 레벨3 사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한 업체는 일본의 혼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스웨덴의 볼보 정도뿐이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의 연식변경 모델에 레벨3 자율주행을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안전 등의 이유로 탑재를 미뤘고 그다음 주자였던 EV9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됐다.
물론 이제 막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이 국내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미 보편화된 레벨2 자율주행은 운전대에 주기적으로 손을 올려줘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속도 설정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반면 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놓고 주행할 순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최고 속도는 시속 80㎞로 제한된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 안팎인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기술 개발 비용 탓에 아직은 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EV9의 레벨3 자율주행은 최상위 트림인 GT-라인에서만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HDP 옵션 가격은 750만원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많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활용하면 다음 단계로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더 범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에도 일부 보조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속 80㎞의 자율주행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령층이나 몸이 불편한 운전자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초창기 모델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저렴한 많은 차종에 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