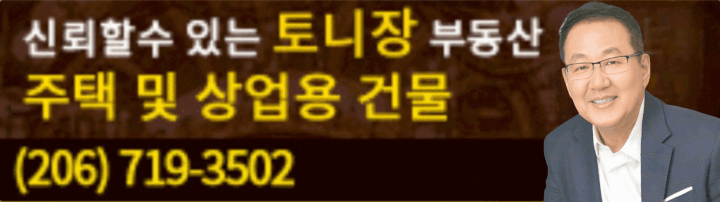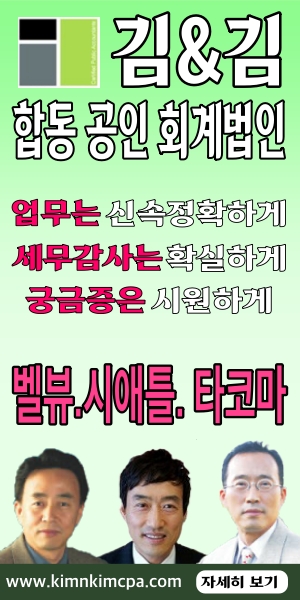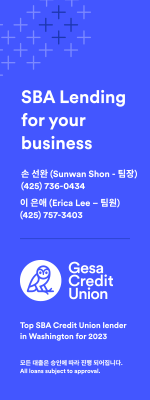경쟁 사회가 낳은 0.78명 비극…"서울 집중 깨야 저출산 해결"[미래on]
- 23-04-04
대학도 직장도 '수도권 쏠림'에 경쟁 과열…생존 앞에서 출산은 뒤로
"정책 나열 아닌 지방 분산이 해결책…지방에 서울대 9개를"
"3명은 낳고 싶었는데 1명 낳고 보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이자 6살짜리 아들을 둔 이윤우씨(가명·38세)는 신혼 시절만 해도 자녀를 3명 낳아 기르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그는 한 명이라도 잘 키워보자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맞벌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이씨 가구는 나름 중산층에 속한다. 하지만 부부 소득에서 매달 쓰는 각종 생활비를 빼면 서울 강북에 세 식구를 위한 18평형(전용면적 59㎡) 집 장만에 꼬박 10~15년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녀를 더 낳기 위해 이보다 큰 집을 목표로 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6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들어갈 사교육비도 큰 걱정이다. 이씨는 "벌써부터 수백만원 짜리 영어유치원을 보내느니 마느니 학부모끼리 사교육 경쟁 심리가 치열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씨 부부가 내린 해법은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씨는 "자녀를 더 낳으면 남들처럼 해외로 가족 여행 한 번 다녀오기도 힘들게 될 것 같다"며 "힘들게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뭐 하러 부족하게 살겠나"라고 했다.
◇자나깨나 '경쟁'에 출산율 0.78명'…"이대로면 월급 절반 부양비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국민연금 보험료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꺼지고 남은 사람들은 노인 부양에 허덕이는 기형적 구조가 미래 현실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 심리를 지목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 이면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 심한 경쟁감이 형성됐다"며 "경쟁 심리가 높으면 생존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후순위가 된다"고 했다.
유난히 서울에 쏠린 좋은 대학·직장을 두고 사람들이 몰린 탓에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과밀 구조 속 한정된 재화는 직장 내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만연화된 경쟁 심리는 개인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면서 남과 비교해 '부족함'을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탄생했다. 이 모든 게 결혼과 출산을 위한 허들을 크게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가 처음으로 결혼하는 나이는 각각 역대 최고인 33.72세, 31.26세에 달했다. 1990년 27.79세, 24.78세에서 남녀 결혼시기가 어림잡아 6년씩은 늦춰진 것이다.
 |
| 1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웨딩타운에 위치한 웨딩드레스 전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DB |
◇'백화점식 정책 나열'했지만, 더 떨어진 출산율…"지역 분산으로 경쟁 압력 낮춰야"
역대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수당과 육아휴직, 난임부부 지원 등 정책을 펼쳤지만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10년 후인 지난해 오히려 0.52명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나열식' 대책을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의 전반적인 경쟁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 구조가 그대로라면 정부의 각종 땜질식 지원이 행해진다 해도 실효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 분산 정책을 통해 수도권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고밀도는 저출산을, 저밀도는 고출산을 의미한다.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인 데 반해 전남은 출산율이 0.9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며 "고출산 지역 청년들이 저출산 지역으로 과다하게 이동하는 한국의 특수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지방 권역 안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조성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력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해 지역에도 직장과 주거, 상가가 한 곳에 있는 직주락(職住樂) 순환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신웅수 기자 |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면 저출산 해결…미국 대학사례 주목해야"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같은 양질의 대학을 지역에 9개 더 만들어 수도권 쏠림 해결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고 제안한다.
전국 9곳의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면 인재와 좋은 직장이 지역에 따라오고, 이러한 연쇄 효과를 통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미국 '오스틴의 기적'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삼성과 테슬라, 애플 등 세계적 첨단 기업이 진출한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중소도시였다.
하지만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가 정치인과 사업가, 대학 총장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자 200만 인구가 몰리고 세계적 기업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기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명문대로 부상하려면 연구 역량 확충을 위한 대대적 재정 지원과 함께 '네임밸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처음에 버클리 캠퍼스만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 대학(UC·University of California) 지위가 로스앤젤레스(LA), 샌디에이고 등 10개 대학 연합으로 확대된 것처럼 '서울대' 명칭을 통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면 '인서울' 대학들의 인재 흡수 효과가 지역으로 분산돼 기업 이전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학벌이라는 상징 자본에도 일종의 '양적완화'가 일어나면서 경쟁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