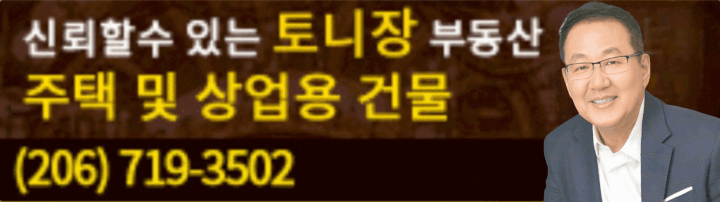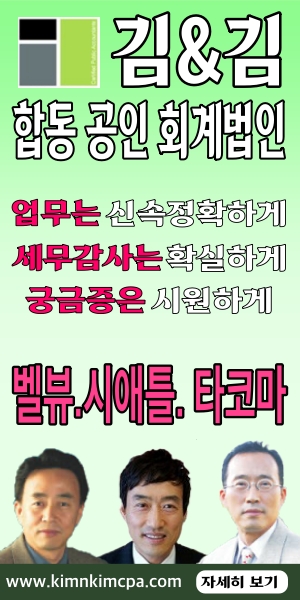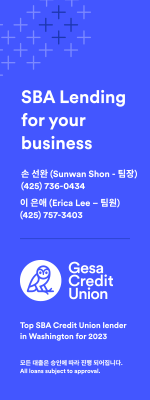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인구소멸 먼 미래 아냐? 5년 후 공장 멈출 수도"[지방소멸은 없다]
- 23-03-12
경남지역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들고 고령화로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자연감소도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청년 인구 유출에 사회적 인구감소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위기지역 59곳 중 경남의 9곳이 포함됐다. 경남 18개 시·군 중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인 것이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데는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의 인구 자연감소는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10년 전인 2012년 1만2792명이 자연증가했으나 계속 줄면서 2018년(–1495명) 감소세로 돌아선 뒤 4년 만인 지난해 10배 가량 늘어난 1만3400명이 자연 감소했다. 이는 2021년 7830명 감소한 데서 1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 지난해 경남은 경북(1만6500명)과 부산(1만3600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자연감소가 높다.
지난해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12년 이후 역대 최저다. 2012년 3만3211명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1만4000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경남지역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10년 전 1.5명보다 두 배 가량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지난해 4.3명에 그쳐 10년 전 10.1명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2012년 이후 역대 최다다. 지난해 사망자는 2만7400명으로 2021년보다 17.1%(4008명) 늘었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3년(1만9994명)보다 37.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8.3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명대를 기록했다.
경남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남의 인구이동은 2017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8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다. 감소폭도 2018년 –5810명, 2019년 –9310명, 2020년 –1만6658, 2021년 –1만3703명, 지난해 –1만8547명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남의 순유출 인구는 서울(-3만5340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의 지난해 순유출 인구 중 20대가 1만6600명으로 순유출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부산, 경기, 서울 등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젊은 층에서 경남을 떠나면서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상위 15개 지자체에 합천(40.97%·4위), 남해(38.92%·8위), 의령(38.42%·11위), 산청(38.34%·12위)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타지역보다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남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앞으로 5년만 지나도 학령인구 감소와 일자리 절벽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보면 한결 같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년 정도 지나면 정말 사람을 못 구해서 산업현장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주하는 도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부족한 산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지원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인구감소는 출산장려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과 정부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