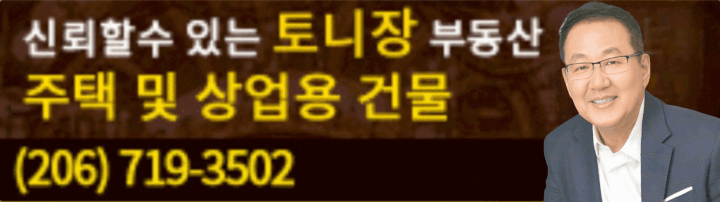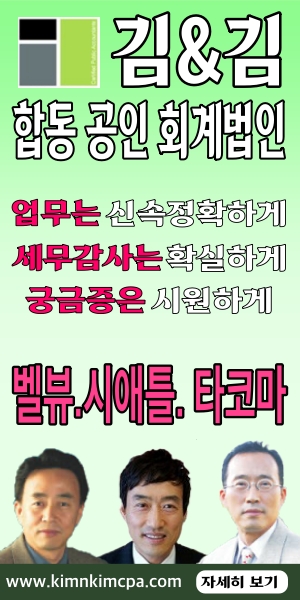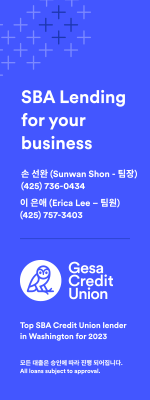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1000만 도시 서울'은 옛말, 943만명으로 줄어…왜 떠났나
- 23-01-22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2021년부터 사망자>출생아
높은 집값에 신도시로 떠나…생활인구는 여전히 1천명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인구는 943만명으로 '1000만 도시 서울'도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됐다.
저출생에 따른 자연감소와 서울의 높은 집값에 3040세대 중심의 탈(脫) 서울화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된 인구는 943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1086명 줄었다.
서울 인구는 1988년 1028만명으로 1000만 인구에 진입 후 1992년 1093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정체 국면이 이어지다 2010년 이후 10년 넘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000만 서울'은 2016년 993만616명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서울 인구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서울 인구는 사망자 수(49만명)가 출생아 수(46만명)보다 많아지면서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55만명)와 출생아 수(43만명)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저출생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서울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3040세대가 '새 집'을 찾아 수도권 신도시에 둥지를 튼 영향도 크다. 실제 김포, 위례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0년 11만5000명, 2015년 13만7000명이 서울을 떠났다.
다만 집값 영향으로 서울을 떠났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서울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인구가 10년 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실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었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 공급량이 세대 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영향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에도 총 가구수는 2029년 413만가구까지 증가하고, 가구 구조도 다양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2인 가구는 2050년 7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집값 등 영향으로 서울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여전히 교육, 직장 등 이유로 서울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1000만명을 밑돌지만 생활인구는 여전히 1000만명대이다. 생활인구는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한다.
하루 평균 생활인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2019년 1128만6995명에서 2020년 1106만1012명, 1076만8002명으로 감소하다가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이후 지난해(1084만1593명) 증가세로 전환됐다.
서울·경인지역 간 출근시간대 통근·통학 인구는 하루 평균 131만명 규모로 같은 시간대 전체 통근 인구 449만명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25개 자치구별로 인구 격차가 극명하다. 2008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송파구의 인구는 67만명으로 분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동구도 둔촌주공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는 15만명, 중구는 13만명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