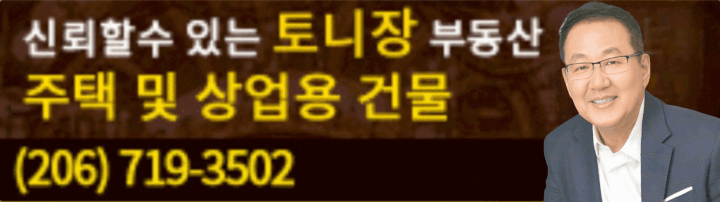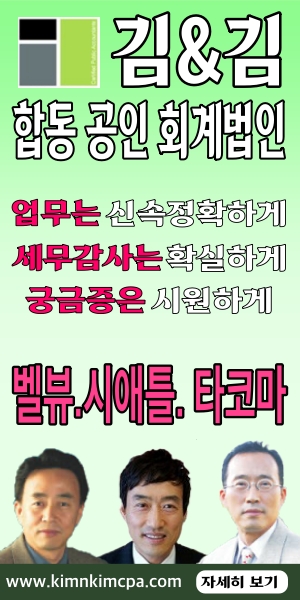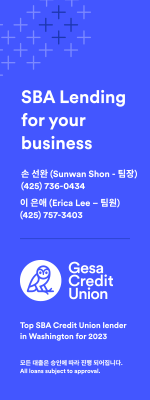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김윤선] 서생원의 새해 인사
- 22-01-24
김윤선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서생원의 새해 인사
차고를 정리한 건 순전히 쥐 때문이었다. 요 며칠, 늦은 밤이면 저들이 겁도 없이 나댔다. 결국, 여분으로 사 놓은 쌀과 강아지 밥이 원인임이 밝혀졌다. 군데군데 너부러져 있는 쥐똥으로 온몸이 오글거렸다.
정말이지 화구를 넣어놓은 통에까지 저들이 드나들었을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하기야 폭설에 이어 비 내리는 시애틀 겨울에 저들인들 먹잇감 구하기가 쉬웠겠는가. 결국은 내 탓이었다. 나는 혀를 끌끌 차면서 화구 박스를 들어냈다.
박스를 펼치니 책상보, 붓통, 물통, 물감 등이 부스스 몸을 뒤척인다. 쥐 소리에 잠을 깬들 어쩌랴, 손이 있어 밀어내겠어, 발이 있어 자리를 옮기겠어, 녀석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어쩌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들을 달랬다. 그런데 얼핏 봐도 물감 몇 개는 시원찮다. 저들이 주인에게 앙갚음할 게 굳는 것 말고 무엇일까.
코로나로 수업이 중단된 후 집에서 홀로 계속하던 그림 그리기도 그만 시들해졌다. 물감은 일 년여 전의 모습 그대로다. 물감 튜브엔 꾹꾹 눌러쓴 손자국이 박제되어 있다. 쓰지 않을 양이면 정돈을 해놓든지, 깔끔하지 못한 내 성정을 나무라듯 저들의 표정이 퉁명스럽다. 후회는 어리석음 뒤에 오는 것, 저들 보기가 민망해서 모른 체 플라스틱 랩으로 꼼꼼히 쌌다. 아직은 쓸만하다, 믿고 싶었다.
원래 그림에 재주가 없어서 나와는 별개의 세계라고 여겼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리게 됐다.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워낙 오래전의 일이고 기초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진전이 더뎠는데 마침내 채색에까지 이르게 됐다. 처음 만난 유화물감에 가슴이 설렜다.
색상이 언어였다. 언어로써 예술세계를 표현하는 문학과는 달리 그림에서는 색상이 도구였다. 같은 물상(物像)을 앞에 두고 같은 자리에서 그리는데 색이 다 달랐다. 갈색의 나무 그릇을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이가 있었다. 파격이고 감동이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가 예술이 갖는 공통분모, 창작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물상과 닮아가는 마음, 그건 결국 마음 비우기였다. 예술이 주는 신선한 선물이었다.
검정은 태초의 색상이 아니었을까. 태양마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을 게다. 동굴, 암실, 아, 어머니의 자궁도 어둠이 아닐까. 신생아의 두 눈이 저토록 꼭 감겨있는 걸 보면. 우리가 숨고 싶을 때 구태여 골방에 찾아드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게다. 검정은 수용과 융합, 그리고 침묵이다. 사제복(司祭服)과 죽음을 배웅하는 상복(喪服)이 검정인 것을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하양은 무(無)다. 자신을 다 내줘야 얻는 색이다. 순수와 맑음, 없음이다. 여린 듯 강한 색, 그림의 세계에서는 쓸모가 많다. 어쩐지 이청준의 단편소설 『흰옷』이 그려진다. 순박하지만 옹골차지 못한 백성, 그러나 오늘날은 하양을 사랑한 백의민족(白衣民族)의 문화가 대세다. K 팝, K 드라마, K 푸드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건 백의가 갖는 내면의 힘이다.
빨강 노랑 파랑의 위세는 홀로서기다. 제아무리 섞어봐라, 나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위엄 말이다. 다양한 색 배합의 근간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기운을 부추기는 초록, 신비의 색 보라, 차분함을 더하는 갈색도 몫을 잃지 않는다. 색이 아름다운 건, 이처럼 저들끼리 나누는 조화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돌아보면 색은 물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인종마다 다른 색의 얼굴들, 다른 색의 꽃나무들, 색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다. 조화를 말하는 이유다.
한때는 노랑과 초록을 좋아했고, 또 다른 한때는 보라와 갈색에 빠져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 또 다른 색을 좋아하고 있는 날 보면서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몸과 마음이 자라던 때와 세상의 고민이 다 제 것인 양 짊어지던 때의 심연이 어찌 같을 수가 있을까. 어쩜 그건 세상과 화합하느라 애쓴 흔적들이 아닐까. 요즘 나는 회색에 자주 눈길이 간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걷고 싶은 내 안의 욕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화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나니 그간의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정리한 듯 개운하다. 쥐똥으로 오글거렸던 처음의 마음도 시나브로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 저들 또한 차고를 들락거렸던 것에 대한 밥값은 톡톡히 치른 것 같다. 모처럼 만나게 해준 이 감성으로 말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시애틀 뉴스
- "아마존, 경쟁사 월마트 정보 비밀리에 수집했다"
- 유니뱅크 지난해 전체적으로 적자났다
- 올해 시애틀이 LA보다 비 적게 왔다
- UW인근 대학가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설치한다
- 알래스카항공 1시간동안 전면 이륙 중단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뉴스포커스
- 민주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 검토"
- '특검 정국' 칼 빼든 민주…尹-李 영수회담 계기로 다시 칼집 넣을까
- 현대차·기아, 美 '최고 가치 전기차' 1~3위 석권…1분기 판매량도 56% 증가
- 50세 이상이면 '단돈 천 원'에 국수 한 그릇…뜨거운 '열풍'
- 앞차는 수배범, 뒤차는 만취…황당한 교통사고 나란히 재판행
- 거야 추경요구에 기재부도 강경모드…재점화된 추경 갈등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 국립대 총장 건의 전격 수용한 尹…'의정갈등' 출구 모색
- 제주도,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재도전
-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 5월부터 '진짜 엔데믹'…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
- 서울 아파트값 제자리인데…압구정 80억, 성수 57억 '신고가'
- 정부, '독도 억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시정 촉구"
- 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축소…한 총리 "자율모집 허용"